좋아서 찾는 학습 서비스,
홈런 중등팀이 고민한 것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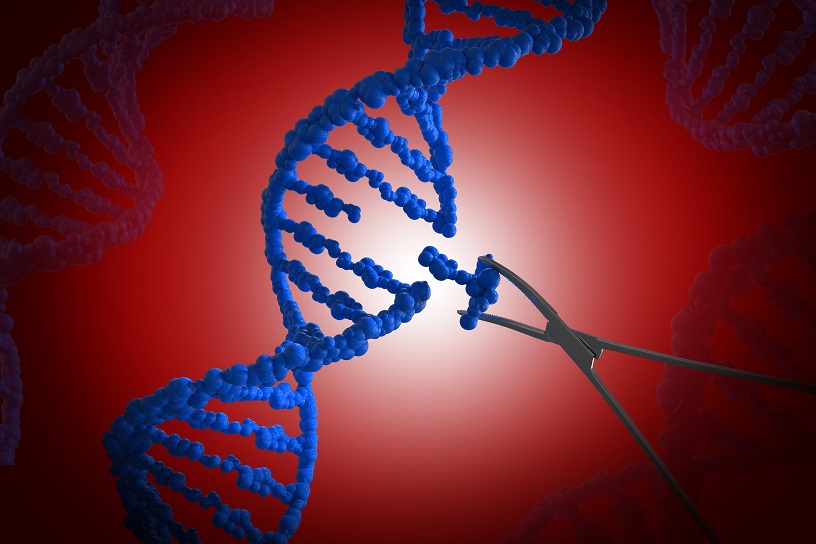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스템(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교육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무인자동차, 드론을 만들려면 이 4개 학문을 익혀야 한다.
수학, 과학은 원래 있던 과목이니 공학과 기술만 추가해서 배우면 되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큰 착각이다. 개별 과목을 서로 연결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 스템 교육의 지향점이다. 가령, 비만 오면 침수가 되는 동네가 있다고 치자. 수학, 과학 지식을 활용해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기술, 공학 지식으로 배수로를 구축하는 일련의 과정이 스템 교육이다.
스템 교육이 이공계 능력만 키워 준다는 시각이 있다. 과목 하나하나가 다 이과 계열이기 때문인데, 그렇지는 않다. 문과든 이과든 상관없이 스템은 범용 학문이다. 문과 지망생이어도 논리적인 사고를 갖춰야 한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변화 속도도 빨라진 만큼, 문제 해결 능력도 필수다. 스템은 이러한 사고의 밑거름이 된다.
‘애플과 구글의 나라’ 미국이 스템 교육 1위일 것 같지만, 최근 들어 그 지위가 위태위태하다.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인해전술’의 나라답게 스템 관련 전공자들을 쏟아 내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중국은 470만 명의 스템 졸업생을 배출했다. 인도가 260만 명으로 2위고, 미국은 56만 8,000명으로 3위에 그쳤다.
양만 많지 질은 형편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지만, 질도 좋다.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Tsinghua University may soon top the world league in science research”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2013~2016년 수학, 컴퓨터 관련 분야에서 칭화대 논문이 42건으로 가장 많이 인용된 것으로 집계됐다는 것이다. 2위 또한 하얼빈공업대학으로 중국이 차지했다. 미국 소재 대학인 스탠포드와 MIT는 3, 4위에 머물렀다.
중국 스템이 약진한 배경에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다. 시진핑 정부는 2017년 2월 스템을 초등학교 정규 커리큘럼에 반영했다. 또 초중고 권장도서에도 스템 관련 서적을 대거 포함시켰다. 퀀텀 컴퓨팅과 드론, 군사용 설비, AI, 유전자 편집 등 종류도 다양하다. 중학생 권장 도서엔 <3세대 유전자 편집 가위>(Third-Generation Gene Editor CRISPR)도 들어갔다. 대학원생이나 볼 법한 책을 어린 학생들이 실제로 읽을지는 알 수 없지만, 중국 정부는 고급 과학 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꾸준히 높여 가고 있다.
일선 학교들도 스템 교육 도입에 적극적이다. 상하이에 있는 화둥사범대학은 최근 레고와 함께 클래스키트(class-kits)를 만들었다. 중국 정규수업 시간을 감안해 45분 과정으로 구성했고, 레고 특유의 창의적으로 흥미로운 접근 방식을 가미했다.
이쯤 되자 미국 쪽에서 마음이 급해졌다. 냉전 시절, 인류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한 러시아를 보듯 중국을 우려 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 스템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이유다. 급기야는 외국 유학생들이 졸업 후 취득하는 H-1B 비자 요건을 완화해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물론 스템 관련 전공자들에 한해서다. 중국, 인도 출신의 고급 IT 인력을 미국에 붙잡아 둬 과학 발전에 기여하게 하자는 것이다.
미국이 긴장할 정도로 중국 스템 교육이 급성장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우선 인력 문제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스템 교육을 전담할 인력이 부족하다. 당장은 과학, 수학 교사가 스템 수업을 병행하고 있지만, 한계가 뚜렷하다. 학문 간 연계는 물론 실생활 적용까지 아우를 수 있는 스템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각종 사교육이 판을 치고 있다. 수많은 기업들이 스템 교육 전문기관임을 자처하고 있지만, 학부모 입장에선 실제로 그런지 확인할 길이 없다. 설령 믿을 만한 기관을 찾는다 해도 수업료가 비싸다 보니, 저소득층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꾼다. 스템 교육에도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정부와 기업, 학계, 일선 학교의 연계를 통해 스템 공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산·학·연·관의 연대에 중국 스템 교육의 미래가 달렸다.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