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까지 이어지는 초등 학습 루틴
초등 습관이 입시 경쟁력을 만든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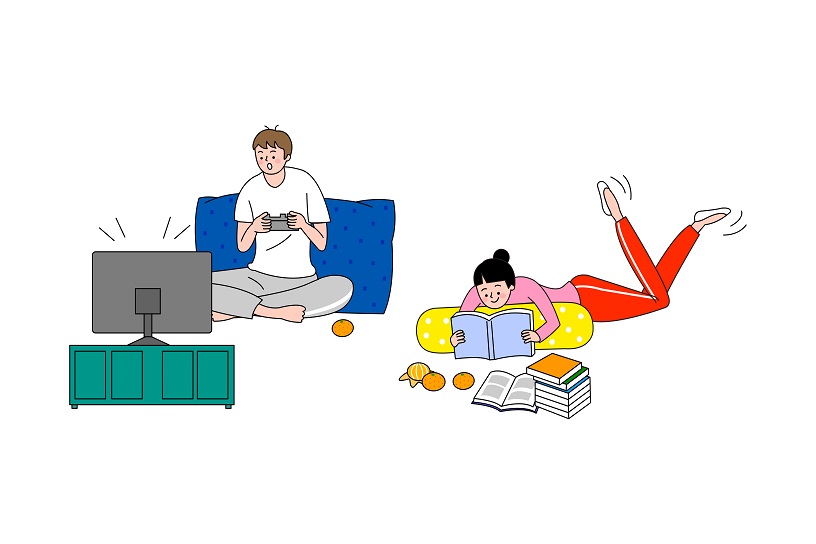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거리를 걷다 보면 많은 사람이 보인다. 다들 어디로 가고 있을까. 나도 그들 중 하나일까. 나만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게 아닐까. 모두가 좋아 보인다. 모두라서 행복해 보인다.
모두는 하나의 공동체 같지만 각각의 ‘나’를 그렇게 묶을 수는 없다. 남의 것이 좋아 보이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그 누군가는 나를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남들’ 같지는 않아도 그 사이에서도 그냥 ‘나’ 같다면 괜찮은 것 아닐까.
배터리가 떨어지면 시계도, 차도, 스마트폰도 작동을 멈춘다. 당연하겠지만 그건 사람도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는 타이밍을 모른다. 전자기기처럼 ‘배터리가 5% 남았습니다. 충전해 주세요.’라는 신호가 뜨면 좋으련만. 닳고 방전될 때까지 움직인다. 일은 끝나도 걱정은 끝나지 않으니까.
잠들 때까지 생각은 멈추지 않으므로 머릿속으로든 입 밖으로든 결국 우리는 무엇을 쓰고야 만다.
나의 마음은 말로 하지 않으면 당신이 알 리가 없군요
사실 나는 매우 게으르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 멀리 여행도 가고 맛집에 줄도 서고 영화와 같은 문화생활도 기꺼이 즐기던데. 내게 하루 휴식이나 틈이 주어질 땐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는다. 누워서 책이라도 보면 좀 생산적일지도. 아니면 넷플릭스라도. 뭐라도 한다면 좋겠지만 나의 게으름은 그 정도도 허락하지 않는다. 자고. 멍 때리고. 뒹굴고. 그게 끝이다.
나의 게으름은 태생적이다. 어릴 때부터 몸과 마음이 편하기만을 바랐다. 부모님은 불안했을 것이다. “쟤가 커서 뭐가 될까?” 한탄이 들려오면 나는 나에게만 들리게 읊조렸다. “뭐라도 되겠죠.”
뭐라도 되고는 싶었지만 아무거나 되고 싶지는 않았다. 기꺼이 게으름을 넘어서서 불편함을 감수할 만한 한 가지를 찾고 싶었다. 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나는 뭘 잘하고 뭘 좋아하지. 위인전 시리즈가 눈에 띄었다. 한 사람의 생애를 저렇게 묶을 수 있다니. 나도 나를 써 보고 읽어 보고 싶었다.
그때부터 답답해졌다. 바라는 만큼 나를 잘 설명할 수가 없었다. 재미없게 살아서 그런 걸까. 인생에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 괜찮게 쓰이는 게 아닐까. 그렇다고 어떤 사건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현재의 나’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설명하고 싶었다. 어휘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했다. 한국어 문법에 관한 책을 샀다. 장르를 불문하고 다양한 작가의 책에 손을 댔다. 기분이 나쁜 날에는 기분이 왜 나빴는지를 제대로 말하고 싶었다. 글씨도 내용도 엉망인 그 글들이, 발표도 할 수 없는 그 글들이 분명 내 모든 작품의 도입이었을 것이다.
전문가들의 칭찬을 받고 싶기도 했지만 아니어도 상관없었다. 어머니와 가까운 친구 한둘을 빼면 내 글을 읽어 주는 사람도 없었다. 그들은 “잘 썼네.”하고 말해 주는 게 전부였다. 정말 잘 썼던 걸까? 그냥 쟤가 저렇게 애를 쓰는 게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지켜 주려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표정은 숨길 수가 없는 것이다. 좋은지 안 좋은지는 얼굴만 봐도 알았다. 그들에게 읽어 달라고 한 지 몇 달이 지나고 나는 조금 감을 잡게 되었다. 내가 봐서 좋은 글이어야 남들이 봐도 좋은 글이라는 것.
언제나 내 글의 첫 번째 독자는 나일 수밖에 없다. 쓰고 또 읽으면서 나도 나를 조금 더 알게 되는 것 같다.
방식의 차이일 뿐
글쓰기에 관한 이야기만으로 맺음하고 싶진 않다. 글을 쓰는 게 일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나’에 대해서는 쓰고 있다. 애를. 마음을. 하루를. 기분을. 쓰고 있다. 글로 쓰고 싶을 땐 글로 쓰고, 쓰고 싶지 않을 땐 다른 것을 더 쓰면 된다. 쓰는 일에는 보이지 않는 용량이 있다. 마음을 쓰다가 버틸 수 없으면 비공개 글을 써서 온라인에 남겨 두게 되는 일. 이대로 하루를 다 써 버리기 아까워서 남은 하루를 메모지에 써 보는 일. 모두 쓰는 일이다.
“인생은 한 권의 책”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우리 모두 각자의 삶에서는 작가다. 당신 주위의 사람들, 독자는 가끔이라도 당신을 읽고 싶어 한다. 전할 수 있는 것도, 차마 전하지 못한 것도 언젠가는 해주기를 바랄 것이다. 전화든 문자든 편지든 당신만의 비밀 일기에서든. 잘 전하려면 잘 써야 한다. 잘 쓰려면 많이 읽고 많이 써야 한다. 진부한 얘기다. 책도 좋지만 당신과 가깝고 먼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틈틈이 읽는다면 당신 또한 당신 그리고 사람들의 하루하루에서 빠질 수 없는 독자이자 작가가 될 것이다.
정말이지 나를 포함한 모두 힘을 잃지 말고 ‘잘’ 썼으면 좋겠다. 글은 그저 쓰는 일 중의 하나일 뿐이다. 나는 “힘내”라는 말을 아주 좋아하지는 않는다. 힘을 내기보다는 “지치지 말자”는 말을 좋아한다. 예전에도 지금도 그렇듯 앞으로도 ‘좋은’ 쓰기에 대해서 나는 정확히 말하지 못할 것이다. 부족한 말만 계속할 것이다. 그러니 읽고 쓰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게을러지지 않겠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지면을 통해 만날 수 없지만, 앞으로도 함께 읽고 함께 쓸 것이라고 믿는다.
당신 안에 있는 당신 하나만큼의 자리
위로가 되지는 못할망정 누가 되지는 않을까. 늘 걱정이었다. 함부로 당신의 위로가 되겠다고 말하는 것도 바보 같은 일이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나마 만난 시간 동안 함께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게 곧 마음을 나누는 일이라고 믿는다. 서로의 눈을 직접 바라보지는 못했어도 언제든 또 가깝고 따뜻하게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당신의 자리를 내가 나의 자리를 오롯이 지켜 낸다면 꼭 그렇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 마디를 건네 본다. 감사함과 아늑함을 담아.
“이 시절 내내 몸 건강히 마음 건강히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구현우 시인 | stoyer@naver.com
눈 뜨는 기분으로 시를 쓴다. 숨 쉬는 마음으로 음악을 한다.
듣거나 보거나 쓰거나 말하거나 하면서, 겨우 한 사람이 되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