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까지 이어지는 초등 학습 루틴
초등 습관이 입시 경쟁력을 만든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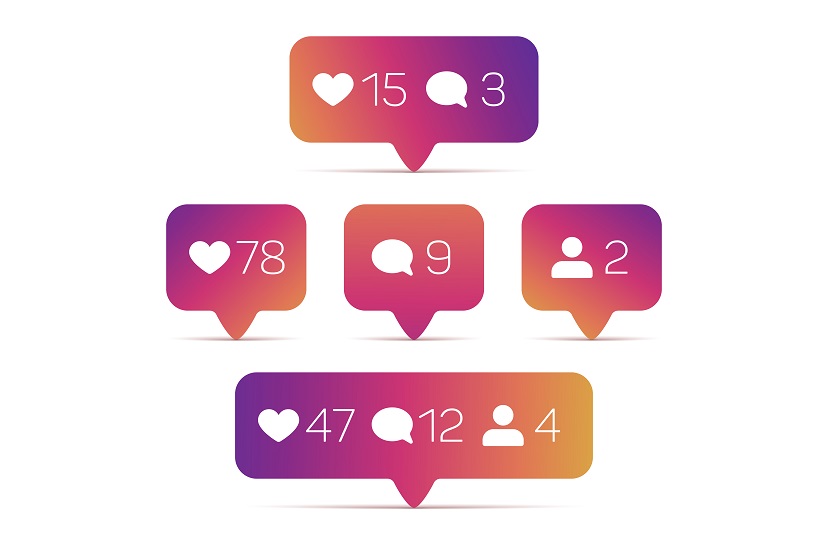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미문을 쓰는 사람들이 부러웠던 적이 있다. 헉, 이게 프로인가. 같은 말도 다르게 하는군. 문장을 유려하게 쓸 줄 아는 사람들은 그냥 잘 쓰는 이들보다도 더 먼 차원의 기술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물론 작품의 퀄리티란 멋진 문장만이 전부가 아니며, 작품 그리고 작가마다 고유하고 어울리는 문장 스타일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글을 ‘잘’ 쓴다는 것과 문장을 ‘잘’ 쓰는 건 조금 다른 문제다.
유니크한 단어. 막힘없이 술술 읽히는 문장. 어떤 글이 멋있는 글일까? 인스타그램에 일상을 아름답게 기록하길 바라는 것도, 한 사람에게 보여 주기 위해 꾹꾹 눌러 쓴 편지도, 누구에게 보여 줄 일 없는 일기도 사실은 하나의 욕망이 관통하고 있을지 모른다. ‘잘’ 쓰고 싶다는 것. 정말 수준 높게 잘 쓴 건 아니더라도 잘 쓰인 것처럼 보였으면 한다는 것. 오늘은 최소한 그런 허세를 충족하기 위한 테크닉을 조금 말해 보려 한다. 여러분이 실제 글쓰기에 적용하기에도 쉬울 것이다.
누구나 조금은 바라지 않는가. 볼품없어 보이기보단 그래도 ‘있어 보이고’ 싶다고 말이다. 뭐가 없는데도 뭔가 있는 듯한, 그런 글을 한번 만들어 보자.
디테일, 디테일이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 각각의 취향은 물론 다르겠지만 좋다고 느끼는 글은 대체로 ‘구체적’일 것이다. 구체적인 글은 읽는 이가 깊이 몰입할 수 있게 만들뿐더러 공감을 불러일으키기에도 좋다. 이유야 여럿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우리가 사는 현실이 실은 별로 단순하지 않다는 데 있다. 걷는 동안에는 ‘저기 나무가 있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건 나무라고 ‘퉁’ 쳐서 말하기에는 아쉬울 수 있다. 나무는 이름을 갖고 있고, 가령 여기서 저기까지 서 있는 나무가 은행나무라고 할지라도 여기 있는 은행나무는 잎이 거의 없을 수도 있다. 하나하나 관찰하자면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쓰더라도 디테일을 더 잡아서 쓰면 달라 보일 것이라는 이야기다. 위의 경우를 문장으로 써 보자.
“저기 있는 나무는 흔들리고 있다. 많은 사람이 자주 다니는 길목에 서 있는 나무다.”
이것을 한번 조금만 다르게 만들어 보자.
“쌍문동 GS25 옆에 있는 은행나무는 만취한 채 비틀거리는 행인처럼 곧 쓰러질 모양으로 서 있다. 바쁜 학생, 발걸음이 무거운 직장인, 신난 아이와 아이의 손을 잡은 엄마와 아빠, 느리게 걷는 노인, 많은 사람이 자주 다니는 길 한가운데에 서서 모두를 가만 내려다보는 것만 같은 나무다.”
이 둘은 같은 상황이다. 아래가 옳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옳고 그름은 없다. 담백함을 좋아한다면 위와 같은 문장을 더 선호할 수 있다. 다만 후자와 같은 방식의 장점은 작가가 읽는 이로 하여금 보다 의도한 세계가 잘 보이도록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독자의 어떤 상상을 제한하기도 한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 세상에 완벽한 문장은 없으니까.)
하나 더 예시를 들자면, 이런 것이다. 인스타그램 등에 ‘있어 보이게’ 쓰인 글은 어디를 갔는지,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가 꽤 명확하다. “친구와 술을 마셨다. 별로 안 마셨는데 취했던 것 같다.”고 쓰는 걸로 끝내지 않는다. “친구와 술을 마셨다. 신선한 체다치즈에 위스키 한 잔, 맥주 한 병을 마시고도 제법 취기가 올랐다.”까지도 말해 준다. 이것은 당신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시작부터 끝까지 결국 오늘 말하는 바는 한 가지다. 구체성, 즉 디테일. “커피는 나에게 쓰다.”는 말이 단조롭게 느껴진다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는 내 입맛에 쓰다.”고 해보자. 확실히 조금 더 선명해지지 않은가.
눈앞에 보이는 이미지를, 당신이 상상한 이미지를 그 안에서 충분히 관찰하면 된다. 없던 문장을 만들어 내자는 게 아니니까. 있는 것을 생생하게, 더 있어 보이게 만드는 방법이다. 당신은 당신의 하루하루가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산책을 하고, 잠을 자고 하는, 그런 비슷한 일상의 반복이라고 느낄 수 있다. 그렇게 쓰면 그렇게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신은 매일 다른 밥을 먹고, 어제와는 다른 업무를 볼 것이며, 늘 같은 곳만을 산책하지도 않을 것이고 같은 코스를 돌아도 매번 바뀐 풍경을 볼 것이며, 어떤 날은 잘 잠들지 못해 뒤척이고 어떤 날은 기절하듯 잠에 빠질 것이다. 차이는 어쩌면 찾아낼 필요도 없이, 이미 있는 것이다. 조금만 오래 바라보면 된다. 세상이라고 하면 세상은 한 단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세상은 수많은 디테일로 이루어져 있다.
구현우 시인 | stoyer@naver.com
눈 뜨는 기분으로 시를 쓴다. 숨 쉬는 마음으로 음악을 한다.
듣거나 보거나 쓰거나 말하거나 하면서, 겨우 한 사람이 되어 간다.